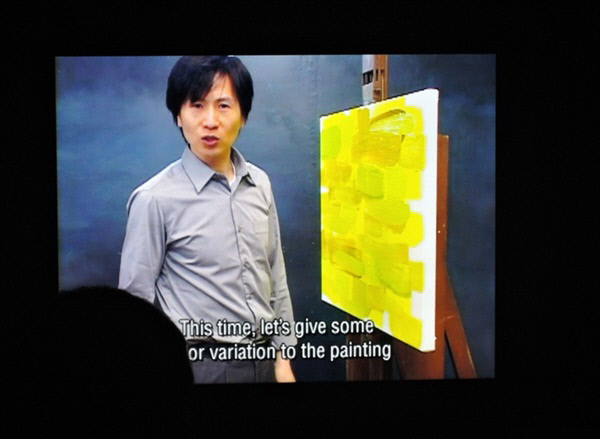|
지난해 이강하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관람객 전시 도슨트(전시 해설) 현장. 이선 제공 |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자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늘면서 주말에도 연장 근무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10대 자녀와 동행하는 한 가족의 도슨트 예약전화가 기억에 남는다. 전시회를 기획한 사람으로서 이 특별한 가족들에게 시각예술 전시회를 어떻게 잘 설명해줘야 할지 어려운 고민과 걱정이 시작되었다. 특히 전시회를 눈이 보이지 않는 관람객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게 되었다.
가끔 특정한 단체나 기관에서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청각 또는 촉각적 감각을 사용하여 기획의 의도까지 점자로 변환하여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안내 서비스의 경우를 보았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특히 그 기간에 이강하미술관에서 진행 된 전시는 일반 성인을 위한 현대 한국화 전시회로 점자로 된 설명 책자나, 원작의 작품을 직접 촉각으로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날 함께 동행 했던 가족들의 도움으로 도슨트는 잘 마무리 되었지만, 나에게 ‘미술의 감상법’ ‘좋은 관람법’이란 무엇인지 전시기획자로써 생각해 볼 수 있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환점이자 경험이 되는 잊지 못 할 순간으로 기억되고 말았다.
가끔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문화생활을 더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더, 잘, 관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 답변과 의견을 나누었던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작품’은 무엇일까? 두 번째, ‘더, 잘, 감상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미술관에서 ‘어떤 감각’으로 관람을 하는 것이 좋은 관람법일까?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다시 요약된다. 그 답을 찾고 생각해보면, 현대미술의 분야는 점점 재료와 주제들이 다양해지고, 내용 또한 어려워지는데 미술관에 온 관람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친숙하게 다가가 마주할 수 있을까? 혼자 또는 같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지 경험해보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이강하미술관에서 전시와 작품을 집중해서 자세히 관람하는 관람객의 모습. 이선제공 |
오랜 미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은 눈, 시각으로 보는 예술작품들의 표면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창작자의 숨겨진 의미 등에 주목하는 감상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현대미술에서도 시각 너머 작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을 시각화하거나 눈앞에 있는 고정된 대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들춰내려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이 전개돼 왔다. 고정된 제도의 틀과 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획일화한 관점으로 중심적인 세상을 보는 데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주변으로 시선을 확장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또한 역사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자에게 예술세계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유동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 본 관점들을 통해 그 본질을 시각으로 드러내려는 창조적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감상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김구림 전시 도슨트를 듣는 관람객의 모습. 이선 제공 |
이를 최근 선천적 맹인인 일본작가가 쓴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 책으로 비유해 보려한다. 시각 장애인, 사진작가이자 20년 넘게 미술관 전시 관람을 하고 있는 미술애호가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비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행복한 전시를 관람하는 자신’의 기록을 담은 책이었다. 미술작품 앞에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끌어낸 상호작용 감상방식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앞에 놓인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꼼꼼히 작품을 관찰하고, 빛의 변화, 인물의 표정과 감정 등의 세부묘사까지 전달하며 전에 혼자 감상 할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 감상법은 MOMA에서 고안한 ‘대화형 감상방법’과 매우 비슷했다. 동행자가 함께 작품에 관한 묘사를 거듭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않고, 결국 해답이 나오지 않거나 대화 도중 모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관람방식이다.
김범 ‘노란 비명 그리기’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뒷모습. 단채널비디오, 컬러,사운드, 31초 6분, 2012년. 리움미술관. |
미술관에 관람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술작품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전시 해설(도슨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대미술 감상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전시 관람법을 숙지하고 감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더 다양해지는 예술의 재료, 장르, 시대 및 역사적 배경, 작가의 생애, 창작자의 개인적 경험 등 어느 방법이 좋은 관람방법의 주요 방향인지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감상법으로 제약을 두지 않고 눈으로 본다는 것을 넘어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또 다른 세계와 나의 생각을 만나게 하고 상상해보는 것, 작품의 이미지와 형상, 미술관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서로의 다른 의견을 사유하여 공유해 보는 방식이 된다면 어떨까...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는 방식은 어쩌면 또 다른 세상(삶)을 바라보는 개인의 태도이자 눈이 될 수도 있다. 현대미술을 ‘안다’, ‘모른다’ 의 경계로 나누지 않고, 예술의 이미지 자체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우리들의 감각으로 전달되어 실마리로 삼으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는 것’, ‘모르는 것’, 그 전부를 한데 아우르는 ‘함께 보기’, ‘함께 나누기’ 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귀로 다 들을 수 없었던 것이 들리고, 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이 보이며, 촉감으로 확인 할 수 없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는 수많은 한계와 시선들을 공유해 볼 수 있는 넓고 깊은 ‘현대미술 감상법’이 있다면, 올해 2024년 ‘예술’을 조금 더 친숙하고 따뜻하게 우리 곁에 둘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