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10일(목) 16:05 |

무굴 제국 황제 샤 자한이 아내 아르주만드 바누 베감을 기리기 위해 지은 인도 타지마할에서 기도하는 인도 사람들. 인도는 역사가 장구하고 과거 찬란한 문명을 이뤘지만 서양중심의 현대 역사에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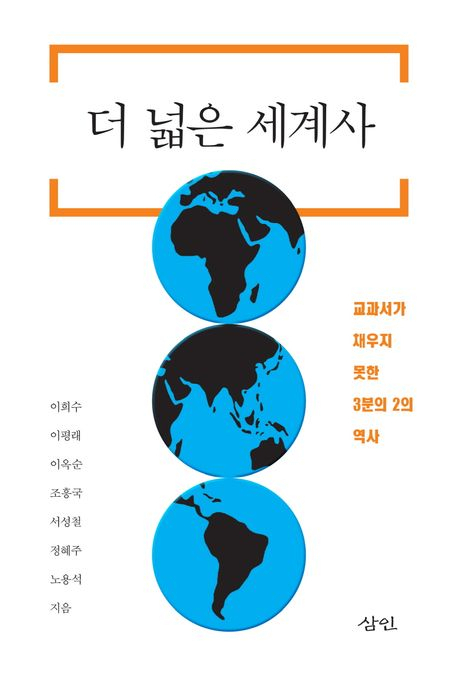
더 넓은 세계사. 삼인 제공
더 넓은 세계사 | 반양장
이희수 | 삼인 | 2만8000원
기존 교과서가 우리에게 가르친 세계관은 서로 맞물려 있는 두개의 동심원과 같다. 마치 지구가 평평하기라도 한 듯이 서구와 동북아시아가 양쪽 중심에 있고, 다른 지역들은 필요할 때만 조연처럼 단역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세계는 두 중심축에서 뻗어나간 동심원이 아니다. 세계는 겹겹이 입체적으로 연결돼 있다. 고대 유럽 문명은 이집트·서아시아와 인적·물적으로 교류하면서 탄생했고,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유사 이래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관계였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도로 스며드는 사이 인도는 동서 양편에 풍요를 선사했고,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삼각무역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중국, 유럽을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동서 양편의 문물을 양쪽으로 전달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발전을 자극했다.
하지만 현대 역사에서 이들 지역과 사람들은 그저 문명의 통로나 성장의 발판으로 이용되고 마는 존재에 불과했다.
당장 로마제국과 중국을 괴롭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으로 알려진 기마 유목 민족의 터전 중앙아시아는 유사 이래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었다. 과거의 찬란한 문명만 박제되어 있는 듯 오해받는 인도의 역사도 장구하다. 인류 문명의 시원이면서 고대 철학과 과학의 계승자였던 서아시아에 대한 편견도 여전하다. 인류사 희·비극의 총체라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나 항상 그늘 속 엑스트라로 취급받던 아프리카 등의 역사도 대부분 편견으로 점철됐다.
신간 '더 넓은 세계사'는 교과서가 채우지 못한 3분의 2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가진 자, 지배자, 식민 강국'의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간 주인공들의 자리에서 세계사를 돌아본다.
실제 세계 최초의 대학은 11세기 초 설립된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과 영국 옥스포드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앞선 970년경 이미 알아즈하르대학이 이집트 카이로에 들어섰다. 말리 중부의 팀북투에 있는 상코레대학도 14세기 초부터 발전했다.
근대 이전 유럽의 의과대학들도 9세기 말~10세기 초 활동한 페르시아인 알라지와 11세기 초 활동한 페르시아계 중앙아시아인 이븐 시나의 저작을 교과서로 사용했다. 중세 고대 철학자들의 과학 연구를 수집·보존·번역하고 쇄신하며 발전시킨 학문의 요람도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남유럽에 걸친 이슬람권에 있었다.
13세기 초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했던 칭기즈칸이 1226년 사망한 뒤, 몽골제국이 분열했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은 쿠빌라이 이후 몽골제국이 일종의 연방제 국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단단하고 잘 닳지 않아 오늘날 각종 공구와 철로의 소재로 쓰이는 고탄소강을 처음 만들어낸 서기전 6세기 남인도인, 신라 승려들이 찾아가 불법을 공부했던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 스리위자야왕국, 1도 없는 상태를 0이라는 수로 처음 인식한 서기 7세기 무렵의 인도인 등도 기존 교과서의 오류와 편견이 만든 좁은 역사의 단편이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회를 이뤄 살아가는 범위를 '세계'라 할 때, 지금까지는 대략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른바 '세계사'에서 소외 돼 왔다. 소외됐던 3분의 2의 세계사를 옹골지게 정리한 필진들은 특히 '가진 자, 지배자, 식민 강국'의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절절히 만들어갔던 주체자들의 자리에서 더 넓은 시야를 보여준다.
